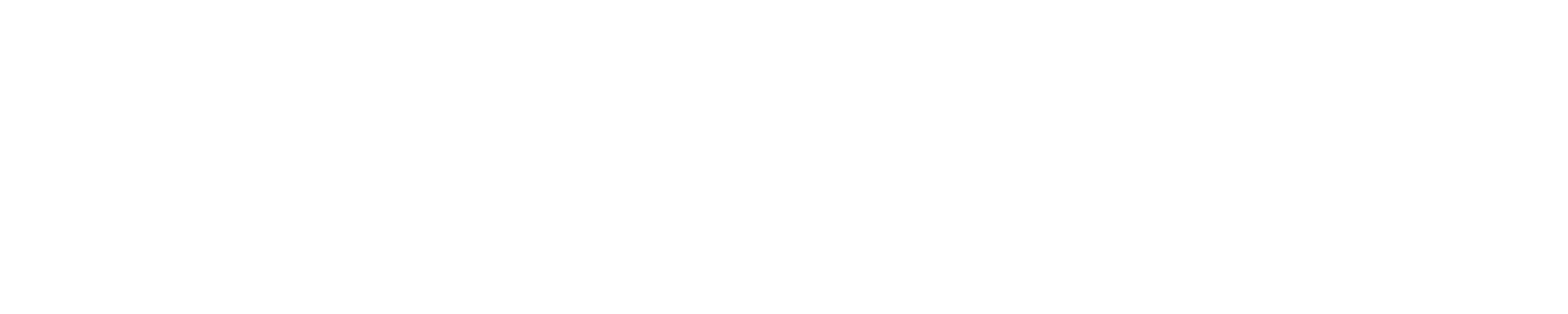조각글오늘의 우리, 내일의 나
SSMRK
24-11-11 01:29
18
異鷹 瞬透
누구에게나 좋아했던 시절이 있다. 항상 사무소에서 모였던 우리는 지부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고등학생인 어린애들뿐이었으므로 시간이 남으면 용돈을 쥐고 거리를 기웃거리곤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말 하나는 참 잘 듣는 녀석들이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노래방을 가거나, 분야가 맞지 않는 쇼핑을 지켜봐 주곤 다시 사무소로 돌아와 내일은 무얼 할지 생각하는 정도였다.
이 동네 말고, 어디 멀리 놀러가 볼래? 와, 그럼 어디로 가요? 세 달 뒤엔 완연한 여름이니 그때쯤에 바다를 가는 게 괜찮지 않겠어. 난 내일 수영복 사러 갈래. 그건 설레발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리는 어린 애들이었다. 한참을 남겨둔 여행에도 들떠서 하고 싶은 일들을 날이 새도록 늘어놓거나 했다. 이제 그만 자. 내일 방과후에 도서관 들렀다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나는 그런 소리를 하며 내일을 기약하며 우리를 재웠다.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아직 오월이 끝나지도 않은 때 사건은 벌어졌다. FH는 인력이 부족한 우리 지부를 송두리째 엎어놓을 요령이었다. 대형 지부나 감당 가능할 졈들을 우리 쪽으로 풀어둔 것이었다. 당연히 견뎌낼 수 없었다. 애초에 어른이라곤 지부장뿐이었고, 우리는 기껏해야 정보 조사를 돕는 녀석들이었고, 싸울 수 있었더라도 강하진 못했으니까.
나는 모두를 뒤로 하고 달릴 수밖에 없었다. 발이 빨랐고, 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었다. 손을 벌벌 떨면서도 가장 어린 애를 살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는 말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애’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알 수가 없었다. 왜 나보다 몇 살은 어린 주제에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왜 ‘괜찮다’고 이야기했는지.
일본 지부에 도착한 나는 말을 전하자마자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달려간 우리 지부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사람은커녕 물건조차 제대로 남은 것이 없었다. 그리도 두껍게 쌓여 있던 책들이 죄 낱장이 되어 부서진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우리 중 온전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 흩어진 몸뚱이를 모아야 겨우 한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우리는 나를 빼곤 보통 연고가 없는 이들이었다. 지부장은 예전에 사고로 가족들을 전부 잃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계셔도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상주 아닌 상주가 되었다. 당장 곁을 지켜줄 게 나밖에 남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당장 전날까지 생생하게 그려나가던 여름 계획을 떠올렸다. 설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애들을 재우지 않았더라면, 꼴딱 밤을 새고 지각하는 바람에 나머지 청소를 하느라 좀 늦게 갔더라면. 애들이 없었다면 지부장은 혼자 몸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부로 향하던 사람들이 빠르게 지원 인력을 부르러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장례식장을 떠나며 드는 생각이 있었다. 생각 따위로 그치지 않는 사실들이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소로 다시 모일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돈을 벌더라도 수영복은 사줄 수 없을 것이고, 운전을 배워도 해변가 드라이브를 시켜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지 못했다.
잊으라, 털어내라는 소리가 지겨웠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치기 어린 꿈을 접었다. 그런 것으론 우리를 지킬 수 없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힘만 셌더라면 한 사람은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자기 전 수백번 되뇌일 뿐이었다.
제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당장 내일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부를 해도, 힘을 길러도, 마음을 가라앉혀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일의 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공포가 숨통을 짓누르고 있었다.
종일 인터넷만 뒤적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탓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가족 같은 사람들을 두고 도망친 녀석과 한 팀이 될 수 없다고 욕하면 어떡하지? 정작 두려운 마음에 나는 그런 글이 올라올만한 곳에 발을 들이지조차 못했다. 길을 걷는 것도 무서웠다. 눈이 마주치면 나를 손가락질하며 헐뜯을 것 같았다. 네가 그 사람들을 죽인 거라고. 조금만 더 빨리 달렸으면 그렇게까진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삼 년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바쁘게 움직이고 밝게 웃는 사람들이 보이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나와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시련을 겪는 사람을 원했다. 와중에 또 그것이 실화라면 견딜 수 없었다. 공감을 원하지만 나와 같은 슬픔을 겪지 않길 바랐다. 픽션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책이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사실이 아니지만 나와 비슷한 남의 이야기라면 그래도 시간을 허비할 수는 있었다.
‘너의 오늘은 누군가의 내일이니까.’ 언젠가 한 번 틀어두었던 영상 속 대사가 나를 바꿔두었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나는 외면하고 있었다. 그 짊어진 내일들이 무거워 피하고 있던 눈을 끝끝내 마주쳐 버린 것 같았다. 우리 중에서 나를 미워했던 건 나뿐이었다. 당신들이 전부 죽더라도 내가 가는 것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적어도 목숨을 건진 나 한 사람의 내일을 그릴 수 있게 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다음날은 서점에 갔다. 좋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진열된 책만 바뀌었을 뿐 서점은 그대로였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꺾어 쭉 가면 있는 만화책 코너도, 카운터 옆에 가지런히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는 형광펜도, 오랜만이라며 나를 반기던 사장님의 얼굴도.
내 오늘에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게 있어 충분히 소중한 날이다. 기억에 매몰되어 삶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들에게 미안한 일은 없을 것이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서도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게 되었다. 차마 이 순간으로 짊어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의 몫을 대신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좋아했던 시절이 있다. 항상 사무소에서 모였던 우리는 지부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고등학생인 어린애들뿐이었으므로 시간이 남으면 용돈을 쥐고 거리를 기웃거리곤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말 하나는 참 잘 듣는 녀석들이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노래방을 가거나, 분야가 맞지 않는 쇼핑을 지켜봐 주곤 다시 사무소로 돌아와 내일은 무얼 할지 생각하는 정도였다.
이 동네 말고, 어디 멀리 놀러가 볼래? 와, 그럼 어디로 가요? 세 달 뒤엔 완연한 여름이니 그때쯤에 바다를 가는 게 괜찮지 않겠어. 난 내일 수영복 사러 갈래. 그건 설레발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리는 어린 애들이었다. 한참을 남겨둔 여행에도 들떠서 하고 싶은 일들을 날이 새도록 늘어놓거나 했다. 이제 그만 자. 내일 방과후에 도서관 들렀다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나는 그런 소리를 하며 내일을 기약하며 우리를 재웠다.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아직 오월이 끝나지도 않은 때 사건은 벌어졌다. FH는 인력이 부족한 우리 지부를 송두리째 엎어놓을 요령이었다. 대형 지부나 감당 가능할 졈들을 우리 쪽으로 풀어둔 것이었다. 당연히 견뎌낼 수 없었다. 애초에 어른이라곤 지부장뿐이었고, 우리는 기껏해야 정보 조사를 돕는 녀석들이었고, 싸울 수 있었더라도 강하진 못했으니까.
나는 모두를 뒤로 하고 달릴 수밖에 없었다. 발이 빨랐고, 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었다. 손을 벌벌 떨면서도 가장 어린 애를 살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는 말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애’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알 수가 없었다. 왜 나보다 몇 살은 어린 주제에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왜 ‘괜찮다’고 이야기했는지.
일본 지부에 도착한 나는 말을 전하자마자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달려간 우리 지부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사람은커녕 물건조차 제대로 남은 것이 없었다. 그리도 두껍게 쌓여 있던 책들이 죄 낱장이 되어 부서진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우리 중 온전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 흩어진 몸뚱이를 모아야 겨우 한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우리는 나를 빼곤 보통 연고가 없는 이들이었다. 지부장은 예전에 사고로 가족들을 전부 잃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계셔도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상주 아닌 상주가 되었다. 당장 곁을 지켜줄 게 나밖에 남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당장 전날까지 생생하게 그려나가던 여름 계획을 떠올렸다. 설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애들을 재우지 않았더라면, 꼴딱 밤을 새고 지각하는 바람에 나머지 청소를 하느라 좀 늦게 갔더라면. 애들이 없었다면 지부장은 혼자 몸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부로 향하던 사람들이 빠르게 지원 인력을 부르러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장례식장을 떠나며 드는 생각이 있었다. 생각 따위로 그치지 않는 사실들이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소로 다시 모일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돈을 벌더라도 수영복은 사줄 수 없을 것이고, 운전을 배워도 해변가 드라이브를 시켜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지 못했다.
잊으라, 털어내라는 소리가 지겨웠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치기 어린 꿈을 접었다. 그런 것으론 우리를 지킬 수 없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힘만 셌더라면 한 사람은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자기 전 수백번 되뇌일 뿐이었다.
제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당장 내일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부를 해도, 힘을 길러도, 마음을 가라앉혀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일의 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공포가 숨통을 짓누르고 있었다.
종일 인터넷만 뒤적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탓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가족 같은 사람들을 두고 도망친 녀석과 한 팀이 될 수 없다고 욕하면 어떡하지? 정작 두려운 마음에 나는 그런 글이 올라올만한 곳에 발을 들이지조차 못했다. 길을 걷는 것도 무서웠다. 눈이 마주치면 나를 손가락질하며 헐뜯을 것 같았다. 네가 그 사람들을 죽인 거라고. 조금만 더 빨리 달렸으면 그렇게까진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삼 년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바쁘게 움직이고 밝게 웃는 사람들이 보이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나와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시련을 겪는 사람을 원했다. 와중에 또 그것이 실화라면 견딜 수 없었다. 공감을 원하지만 나와 같은 슬픔을 겪지 않길 바랐다. 픽션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책이든,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사실이 아니지만 나와 비슷한 남의 이야기라면 그래도 시간을 허비할 수는 있었다.
‘너의 오늘은 누군가의 내일이니까.’ 언젠가 한 번 틀어두었던 영상 속 대사가 나를 바꿔두었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나는 외면하고 있었다. 그 짊어진 내일들이 무거워 피하고 있던 눈을 끝끝내 마주쳐 버린 것 같았다. 우리 중에서 나를 미워했던 건 나뿐이었다. 당신들이 전부 죽더라도 내가 가는 것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적어도 목숨을 건진 나 한 사람의 내일을 그릴 수 있게 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다음날은 서점에 갔다. 좋아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진열된 책만 바뀌었을 뿐 서점은 그대로였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꺾어 쭉 가면 있는 만화책 코너도, 카운터 옆에 가지런히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는 형광펜도, 오랜만이라며 나를 반기던 사장님의 얼굴도.
내 오늘에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게 있어 충분히 소중한 날이다. 기억에 매몰되어 삶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들에게 미안한 일은 없을 것이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서도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게 되었다. 차마 이 순간으로 짊어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의 몫을 대신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